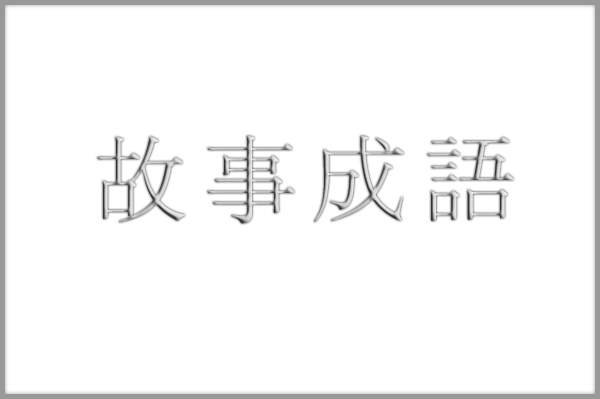笑 中 有 刀 '웃음 속에 칼이 있다'는 뜻 겉으로는 좋은 체하나 속으로는 도리어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뜻. 笑 : 웃을 소 中 : 가운데 중 有 : 있을 유 刀 : 칼 도 《구당서(舊唐書)》이의부전(李義府傳)에 나오는 말이다. 당나라 태종 때 이의부라는 사람이 있었다. 그는 문장에 능하고 사무에 정통했다. 고종이 즉위한 뒤 무측천(武則天)을 왕후로 세우려고 했을 때 이의부는 적극 찬동하여 황제의 신뢰를 얻었다. 그는 겉으로는 온화하며, 얼굴에 항상 미소가 끊이지 않았으나 대신들은 모두 그 마음속이 음험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"소중유도(笑中有刀)"라고 수근거렸다. 이의부는 자기에게 거스르는 자는 문책하고, 자기에게 편드는 자를 모아 돈벌이를 했다. 그리하여 벼슬을 바라고 이익을 구해 그를 찾는 자가..